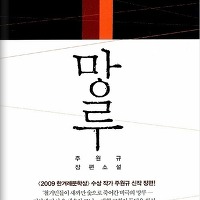빵과 장미
|
빵이 아닌 장미를 들고 꿋꿋이 서다 |
<빵과 장미>의 책 표지는 원본과 우리나라의 것이 참 많이 다르다. 원본은 굉장히 어둡고 쓸쓸한 반면 우리나라의 것은 마치 로맨틱 코메디물 같은 느낌을 준다. 사실 <빵과 장미>가 20세기초 암울한 노동 현실 가운데 있지만 원본의 표지처럼 어둡지 않고 경쾌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원본이 저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격적인 표지가 그려진 것이 이해가 되었다.
'빵과 장미'는 익히 알려진 문구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익숙해 진 <빵과 장미>는 1912년 미국의 대규모 파업에서 등장한 구호다. 이 파업은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켜 결국 노동자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노동사에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임에는 분명한 듯하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언급되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
누구는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은 먹을 것도 모자란다는 건 불공평했다. 그게 엄머가 파업을 하는 이유다. 로사도 그건 알았다. 하지만 이길 방법이 없었다. 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없고 공장주들은 너무 강했다. 공장주들이 굴복하기도 전에 노동자들은 굶거나 얼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서명한 카드에는 '파업이 지속되는 한'이라고 쓰여 있었다. 파업이 지속되는 한. 엄마와 애나 언니와 꼬마 리치는 파업이 끝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
워킹푸어working poor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가난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2010년 지구촌의 모습이다. 우습게도 100년전에도 상황은 같았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더 극단적으로 보여진다. 군인들의 총은 하늘을 향해 있지 않다. 다섯걸음 앞에 있는,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세끼 먹고 추위를 이겨낼 석탄 한삽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을 향해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6채의 집과 셀 수 없는 자동차가 아니라 빵과 장미가 있는 삶이다. 빵만 있는 삶은 얼마나 삭막한가.
|
좀스러운 범죄나 끔찍한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빵이 넘치고 돌에서 장미가 자라는 새로운 삶. 그것을 향해 달리는 기분은 정말 야릇하고도 황홀했다. |
소설 <빵과 장미>는 당신의 상황에 10대 초반의 소녀 로사와 소년 제이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 소설은 굉장히 잘 읽힌다. 소년 제이크의 성장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로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훔쳐보는 듯 하다.
엄마와 애나 언니가 파업에 참여하면, 빵과 당밀 살 돈마저도 떨어질 것이다. 로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을 리가 없다. 엄마는 파업에 뛰어들기에는 애나와 로사와 꼬마 리치를 너무나 사랑한다.
노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 약자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평생 벌 돈은 매일 만질 수 있는 위치 있다. 그런 그들이 부정을 저지른다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연대'뿐이다. 더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거대하고 강력하며 정당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랬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로사를 설득할 수 없었다. 로사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사악한 짓이라고는. 말도 안 된다. 엄마가 말했듯이, 일하면서 굶느니 싸우면서 굶는 게 나았다. 군중의 힘은 모인 사람들의 힘을 다 모은 것의 덧셈이 아니다. 제곱은 될 것이다. 누군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걷는다면... 그것만으로 가슴이 뛰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중요한 일처럼 느껴질 거다. 언니는 마치 파업이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멋진 일인 행동했다.
저 녀석이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것에 대해 뭘 알까? 먼지에 질식당하는 건? 기계에 사지가 절단되는 걸 감수하는 대가로 푼돈이나 받는 건?
|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 어느 곳에도 있는 게 아니었다. 있었던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가고 있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있지 않은 것이다. 창문 밖은 아름다웠겠지만 - 사실 그랬다. 로사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 로사에게 그곳은 아무 곳도 아니었다. 그저 차창 틀에 끼워진 스쳐지나는 풍경에 불과했다. |

|
우리는 결코, 우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으리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으리
그건 엄마였다. 엄마는 아름다운 나무였다. 로사의 어린 시절이라는 봄에 엄마는 푸르고 무성한 나무였다. 그때는 아빠가 살아계셨고 먹을 것과 땔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엄마는 꿋꿋이 서 있었고, 엄마의 앙상한 가지들은 눈보라에 맞서는 은銀처럼 강했다. 엄마는 굽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
'책장사이를 지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희곡] 지하철 1호선 - 지하철 1호선 안 인간군상들의 이야기 (0) | 2012.07.20 |
|---|---|
| [소설]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 - 탈연애주의자를 꿈꾸다. (0) | 2012.07.19 |
| [소설] A - 슬프고 눅눅하고 불길하며 기괴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0) | 2012.07.19 |
| [소설] 망루 - 망루로 내몰린 약자들 (0) | 2012.07.18 |
| [소설] 유령여단 - 목적을 가진 삶이 간직한 슬픔 (0) | 2012.07.18 |
| [소설] 잉여인간 안나 - 영원한 삶, 빛과 그림자 (0) | 2012.07.06 |
| [소설] 유랑자 -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유랑하다. (0) | 2012.07.06 |
| 좌파하라 - 탈자본주의 세계를 꿈꾸다 (0) | 2012.07.06 |
| [소설] 화성연대기 - 디스토피아지만 멋진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0) | 2012.07.03 |
| 물구나무 서는 여자 - 그녀는 왜 병원에서 나체로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었나?! (0) | 2012.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