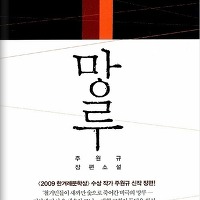소설 A
|
슬프고 눅눅하고 불길하며 기괴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
'오대양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주전이다. <타살의 흔적>에서 잠깐 언급되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나 하고 잠깐 찾아 보았던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하성란의 <A>를 읽게 된 것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도 되나 하고 생각했다.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32명의 죽음'이라는 것에서 모든 픽션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아니었다. 그들의 죽음과 죽음 이 후 남은 사람들이 다시 함께 모여 산 것까지 사실이었다. 깜짝 놀랐다.
단지 작가의 도발적 상상은 다음 문장에 있다. "어쩌면 그녀들은 일부러 아이들을 출산했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 그녀들과 관계한 남자들 대부분이 유부남이었다. 혹시 신신양회의 어머니는 그녀들이 낳은 아이들을 빌미로 내세워 사업을 확장시켰는지도 모른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1982년 일곱 명의 아가씨들 중 네 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기들을 낳았다"
'놀랄 일이 하도 없어 겨우 세숫대야에 떨어지던 대추에나 놀라던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 '나'는 22인의 죽음들 그 한가운데 있던 눈 먼 소녀다. 이 눈먼 소녀라는 설정이 이야기의 흐름상 많은 구실을 해 주지만 글을 읽다가 불편해 질 때가 종종있다. 아래와 같은 문장을 보았을 때다. 어느 정도는 우리네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지만 텔레비전 속의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눈 먼 소녀가.... 흠... 그리고 연예인의 이름을 '김준'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작가가 '김준'이라는 연예인을 몰라서 그런 것 같지만(혹 좋아해서?!?) 독자 입장에서는 특정 인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
그때 눈에 띈 게 바로 텔레비전 속의 김준이었다. 볼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는 위를 향해 치닫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불안과 고독이 느껴졌다. |
이 소설이 풍기는 톡특한 분위기 때문인지 평론가 황광수의 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된 과일향이 풍기는 소설이었다. 눅눅하고 불길하면서도 기괴하고 슬픈 이야기였다. '나'의 이야기가 아닌 신신양회가 있는 마을 주민의 입을 빌려 쓰여졌다면 어땠을까? 또 다른 분위기의 소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듯이 '김순옥은 서정화를 낳고 서정화는 서정인과 그의 자매를 낳고 서정인은 서준하를 낳'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듯이 기태영도 어두운 욕망에 사로잡혀 신신을 무너지게 만든다. <A>는 그들이 성서 속 인물들처럼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처음과 달리 희망적이다. 단적으로 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 하지만 '내림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실뜨개와 같아 한 코 한 코가 다른 코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후의 삶은 어찌 될 지 모른다.
소설 제목인 <A>는 무슨 뜻일까? 소설 속에서는 명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다.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쓰인 것처럼 지나간다.
|
김준 앞으로 배달되었다던 편지. 주홍 글자 A는 혹시 아마조네스의 A였을까. 종족을 불리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많은 남자들에게 선물로 보앴다던 아마조네스 부족처럼 자신을 닮은 여자 역시 스스로 김준의 선물이 된 건 아닐까. 전설 속 부족인 아마조네스는 아들을 낳으면 남자들에게 돌려보내고 딸을 낳으면 자신들이 키웠다고 한다. 아이 아버지에게는 대신 푸른 보석을 보냈다고 한다. 푸른 보석과도 같은 여자들. |
|
나는 글이 살아 저 혼자 내달리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막연히, 이런 게 글의 생명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은 내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글은 제 스스로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며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꾸며냈다. 글이 술술 잘 풀리면 풀릴수록 나는 일부러 글쓰기를 멈췄다. |
|
내가 바란 것은 평화롭고 소박한 삶이었다. 평화롭고 소박한 삶. 어쩌다 이것이 이렇듯 거창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중국 오지에 있다는 여인국 모쒀족 여자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곳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성(成)을 따르고 집안의 모든 재산은 딸이 물려받았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만나고 사랑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 결혼이 없기에 이혼도 없다. 그에 따른 상처도 없다. 그녀들은 욕심없는 삶을 살아간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랑을 붙잡지 않는다. 소박하고 너그럽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그냥 품어줄 뿐이다. 보듬어줄 뿐이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다. 나는 모쒀족 부락 한가운데 있다는 커다란 호수를 그려보다 잠이 들었다. 상상 속에서 호수는 늘 푸른빛이다. 손이 시릴 정도로 푸른 호수다.
|
|
프랑스의 한 소설가는 미래에는 순수한 모계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내다봤다. 남자들이란 기껏 여자들의 쾌락에 이용되는 장난감 신세로 전락하고 말 거라고. 여자들 스스로가 여자의 수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뱃속의 아기 성별을 알아 여자아이인 경우 낙태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그의 뜻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대부분이 소설가 특유의 신랄한 독설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
|
신은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그에게서 모든 여성의 기관들을 끄집어냈다. 그 기관들을 가지고 신은 새로운 인간을 창조했고 '여자'라고 불렀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면 나누어졌던 기관들이 뒤섞인다. 남녀의 사랑이란 둘이 만나 비로소 오래전 하나였던 본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행위가 아닐까.그것은 부끄럽거나 감출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
왠지 <A>의 나는 작가 본인의 감정이 많이 투사되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면 어느 순간 이야기에 홀려 자신이 '나'인지 작가인지 잃어버린 걸까? 특히 작가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것만 같았다. 뭐... 그녀에게는 '나'처럼 글을 쓰는 행위가 있으니까.
|
누구에게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난 누군가 내게 불쌍하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무섭지 않았느냐고 꼭 안아주길 바랐다. 난 위로가 필요했다. |
'책장사이를 지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희곡] 유리 동물원 - 부서지기 쉬운 유리 동물원 (0) | 2012.07.22 |
|---|---|
| The somebody - 내 이름은 대니 샌티아고 : 나를 위한 소설 (0) | 2012.07.22 |
| 자궁의 역사 & 버자이너 모놀로그 (0) | 2012.07.21 |
| [희곡] 지하철 1호선 - 지하철 1호선 안 인간군상들의 이야기 (0) | 2012.07.20 |
| [소설]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 - 탈연애주의자를 꿈꾸다. (0) | 2012.07.19 |
| [소설] 망루 - 망루로 내몰린 약자들 (0) | 2012.07.18 |
| [소설] 유령여단 - 목적을 가진 삶이 간직한 슬픔 (0) | 2012.07.18 |
| [소설] 빵과 장미 - 빵과 장미를 들고 맞서다!! (0) | 2012.07.18 |
| [소설] 잉여인간 안나 - 영원한 삶, 빛과 그림자 (0) | 2012.07.06 |
| [소설] 유랑자 -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유랑하다. (0) | 201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