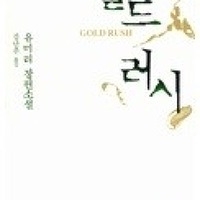<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우리에게 익숙한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유리 동물원>은 얼마전에 대학로에서 공연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볼 기회가 있었고 매력적인 제목과 고전의 포스 때문에 보고 싶었지만 무기력한 몸뚱이를 이끌고 대학로 행차를 하기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 후 아쉬움이 컸다. 보러 갔으면 좋았을 껄하고... 그래서 공연의 아쉬움을 달래려 <유리 동물원>을 읽게 되었다. 극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 일 줄 몰랐다. 우리는 항상 고전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뭐... 나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도스토예프스키나 남미의 거장들이 쓴 힘있고 거대한(?) 글을 기대하는 것이다. 거시적인 사건에 대한 포커스에 소름끼쳐하면서도 매력을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오만과 편견>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고전으로서 알려진 작품이고 제목이 주는 느낌이 강렬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냥 사랑이야기였다. 물론 디테일과 미시적 사건의 중요성등을 들여다 봐야겠지만 내게 고전의 고정관념이 있었기에 충격이었다. 이 작품도 그랬다. 멋드러지게 멋을 낸 고전을 기대했었나보다. 극을 위한 희곡을 읽으면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다. 어떤 극단이 만들면 이렇게 평범하고 식상하게 될 테고 실험적인 극단이 만들면 꽤 독특하게 되겠지라는 생각도 하게된다. 그런 면에서 <유리 동물원>은 해석과 표현방식에 따라 크게 다른 극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단 네명의 등장인물 아만다, 로라, 톰, 짐으로 인해 연극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극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액션영화는 감정씬이 중요치 않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잔잔한 드라마에서 감정씬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무대연출보다 연기가 더 중요시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함부로 무대 위에 올리기 힘든 극일 지도 모르겠다.
희곡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희곡 뒤에 붙어있는 작품설명을 읽었다. 그리고 대부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치 내 생각인 듯 생각하게 되어버렸다. 다른 생각을 하기는 힘드네. 로라와 일각수의 동일시가 로라의 대사로 드러난다. (미소를 지으며) 그 놈이 수술을 받았거니 생각하면 그만이예요. 덜 괴상하게 보이도록 뿔을 떼냈다고 말예요! 이젠 일각수는 다른 말들과 마음 놓고 어울릴 거예요, 뿔이 없는 말들과도 말예요....... 로라는 짐을 만나게 되어 그동안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였던 일각수를 버리고 평범한 말이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일각수의 뿔을 부러트린 것은 짐이며 로라가 외부세계에 갖는 뿔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도 짐이다. 결과는 좋지 않지만 과정은 좋았다. 로라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내가 싫다.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는 터이지만 예술의 세계에서는 사진과 같은 정확함은 중요시되지 않으며, 진심이나 인생, 도 현실이라든가 하는 것은 유기체여서 본질적으로는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만 표현 또는 암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관상의 모습과는 별개의 형으로 바꾸는 것, 즉 변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p.15 ㅣ 범우
아침마다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 "일어나서 기운 내자, 일어나서 기운 내!"하고 소리칠 때면 난 혼잣말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한다고요. 그래도 난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하는 거예요! 한 달에 65달러를 벌기 위해 난 하고 싶은 것, 모든 꿈을 포기하고 말예요!
pp. 60-61
전 바람 따라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도시란 도시는 낙엽처럼 내 곁을 스쳐 갔습니다. 밝은 빛깔이지만 가지에서 흩날리는 잎새처럼 말입니다. 전 떠돌아다니는 걸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에 늘 쫓기고 있었죠. 그것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짓눌렀고 덮치곤 했답니다. 어쩌
면 그것은 귀에 익은 음악이기도 했고, 투명한 유리 조각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롭게 말입니다.
p. 183
'책장사이를 지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트렌드 코리아 2013, 대한민국의 2013년을 주도할 트렌드를 엿보다 (0) | 2013.02.08 |
|---|---|
| 지옥설계도의 저자 이인화 작가와의 만남 (0) | 2012.12.11 |
| 위키리크스 : 권력에 속지 않을 권리 - 위키리크스 이해하기 (0) | 2012.08.02 |
| 청소년 감정코칭 - 감정도 코치가 필요하다고? (코치부모추천도서) (1) | 2012.07.29 |
| [소설] 골드러시 - 돈을 향한 잔인한 욕망 (0) | 2012.07.23 |
| The somebody - 내 이름은 대니 샌티아고 : 나를 위한 소설 (0) | 2012.07.22 |
| 자궁의 역사 & 버자이너 모놀로그 (0) | 2012.07.21 |
| [희곡] 지하철 1호선 - 지하철 1호선 안 인간군상들의 이야기 (0) | 2012.07.20 |
| [소설] 나는 이제 니가 지겨워 - 탈연애주의자를 꿈꾸다. (0) | 2012.07.19 |
| [소설] A - 슬프고 눅눅하고 불길하며 기괴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0) | 201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