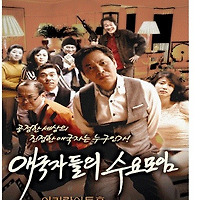|
숙이에게 달려가 묻고 싶다... 아야, 괜찮냐 |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보고 나면 끊임없이 영화에 흐르던 calling you를 한동안 흥얼거리게 된다. 연극 <괜찮냐>를 보고 난 후에도 그랬다. 서정적이면서도 불안한 음악이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극장 안을 메우고 공연 중에도 무수히 반복된다. 잘못 누른듯한 건반 혹은 두개의 건반을 동시에 눌러버린 듯한 하나의 음정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이 새소리, 물소리를 동반한 평화로운 느낌을 압도한다. 그 불안함과 슬픔은 극이 펼쳐지는 내내 관객의 마음을 짓누른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괴안리다. 제목과 통하는 동네다. 괜찮니의 사투리같은 어감을 사용한 것이다. 제목이 '괜찮다'였다면 그건 단순히 반어법이겠지만 <괜찮냐>는 숙을 향한 위로다. 장씨의 '아야 괜찮냐'는 숙을 향한 장씨의 마음을 드러낸다. 물론 장씨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대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긴하다. 폭력과 폭언이 상냥한 몸짓과 챙김 사이에 나타난다. 장씨가 숙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도 그가 고자라는 자격지심과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극에서 이름을 가진 것은 숙이 뿐이다. 김씨, 장씨, 강의사, 김씨 아줌마, 공무원 청년으로 칭해지는 이들은 결국 우리 중 누구나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당신이 김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가해자가 아닌 것이 맞는지 주위를 둘러보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우리의 숙이 우리 곁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가 고통을 주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연극 <괜찮냐>는 전혀 괜찮지 않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숙이집의 화제 원인, 숙이 장씨와 함께 살게되는 과정, 장씨가 숙에게 성매매를 시키게 되는 과정이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숙이의 집에 화제가 나고 남편과 아이가 죽고 숙이 시력을 잃는 것은 짧은 장면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들을 설명함에 있어 더 잔인하고 비극적인 소재를 넣을 수도 있다. 물론 설명되어지지 않아서 관객이 마음대로 상상해 볼 여지가 있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관객의 상상을 위해서는 작은 복선이나 일말의 힌트를 놓아두는 것이 관객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 상징들이 작가의 의도가 아니어도,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도 그것은 관객 각자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한 숙이의 집 화제는 방화다. 그리고 그 범인은 장씨이거나 김씨 아줌마라는 생각을 했다. 장씨는 고자에 부모가 떠나고 남겨져서 혼자가 된 인물이다. 반면 숙이는 떠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장씨가 우연히 듣거나 목격하게 되고 그것이 장씨를 미치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다. 김씨 아줌마의 경우 외국에서 온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는 대사가 있었고(장씨도 있었지만 그건 본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과 뉘앙스이긴 했다), 김씨가 음흉한 눈빛으로 숙을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다. 물론 이 경우라면 김씨 아줌마는 숙이 밖에 있다는 상황을 놓친 것이다. 면사무소 청년과의 대화에서 혼혈아를 견딜수 없어하는 대사가 나와 어쩌면 아이를 대상으로 한 방화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가가 놓아둔 상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숙이 비녀(?)로 장씨의 눈을 찌르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장씨가 방화를 했다면 그 불로 인해 숙이는 눈을 잃고 말을 안하게 된다. 장씨가 한 행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장씨가 숙이의 머리에 꽂아준 비녀(?)가 다시 그에게 돌아와 그의 눈을 잃고 말을 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장면과 연결해서 그가 방화를 했다는 가정이 가장 그럴싸하다.
장씨가 고아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않았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는 모습은 살아남기 위해 몸에 뵌 습관일 것이다. 그는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다 숙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숙은 고아가 되어버린 자신의 분신과 같았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숙을 향한 분노와 안타까움은 결국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를 돌보던 숙은 돌봄을 당하게 된다. 상실과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실성한 상태임에도 임신을 한 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장씨의 의해서 그것이 거부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숙은 장씨를 자신의 돌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녀는 장씨에게 밥을 떠먹이며 웃는다.
불이 났다. 숙의 남편과 아이가 불탄다. 숙은 견딜 수가 없다.
다시 불이 났다. 숙의 동거인과 죽은 아이가 불탄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숙도 함께 불탄다.
연극 <괜찮냐>는 끔찍한 비극을 다루고 있으면서 한국에 시집을 와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진다. 면사무소직원은 몇 년 뒤면 다문화가정의 수가 10%에 이를 것이라하고 강씨부인은 이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한다. 불과 십몇년전만해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단일민족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마치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로 고귀한 피라도 흐르는 것처럼 말이다.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배타적이거나 고립되어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도 그땐 그랬다.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화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이 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 왈가불가할 것은 못된다. 백퍼센트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결혼이 얼마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서로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교환하는 일종의 거래가 되는 셈이다. 이 거래가 잘 이루어져 서로 행복하게 살면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연극 <괜찮냐>에서 보여지는 이주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점이다. 아니 너무나 자주 보여진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관심이다. 외부 사회가 닫힌 공간인 괴안리에 관심을 가져서 숙이를 수렁에서 꺼내 줄 수 있었어야 한다. 아니 수렁에 빠지지 않게 했어야 한다. 괴안리는 마치 대한민국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으로 뚝 떨어진 이주여성들은 닫힌 공간 대한민국에서 괴롭다.
아, 연극 <괜찮냐>에서 언급해야 할 부분이 또 있네. 배우들의 연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잘 해낸다. <괜찮냐>를 공연하다보면 육체보다는 마음이 힘들 것만 같다.
리뷰 끝!하고 저장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 그냥 덧으로 붙임.
덧1.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극을 보면서 영화 <나쁜남자>가 떠올랐다.
덧2. 비극을 보여줄 때 그 비참함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행복하게 살던 시절을 보여주는 것이 흔히 쓰이는 이야기 방식이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같이 말이다. 하지만 연극 <괜찮냐>에서는 과거의 행복한 시절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다. 근데... 난 그게 더 좋았다. 너무 전형화되어있어서 행복한 시절에 시간을 할애했다면 조금 짜증났을 수도. 물론 그 장면에 뭔가 단서나 상상력을 동원할 거리를 넣었다면 즐거웠을 수도.
'무대를 바라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극] 철수영희 - 스물아홉의 청춘별곡, 서른이 되어도 변하는 건 없어 (0) | 2012.06.28 |
|---|---|
| [퍼포먼스] 굴레 욕 (慾‧欲) - 천오브제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삶의 모습 (0) | 2012.06.28 |
| [연극] 하녀들 - 파팽 자매의 다락방을 훔쳐보다 (0) | 2012.06.28 |
| [연극] 달님은 이쁘기도 하셔라 (0) | 2012.06.28 |
| [무용] 기다리는 사람들 Ⅱ - 반세기를 마주 앉아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0) | 2012.06.27 |
| [연극] 3285 -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3285일 후 (0) | 2012.06.27 |
| [연극] 기묘한가 - 그 집은 왜 기묘해져야 했나?! (0) | 2012.06.27 |
| [연극] 당신의 자살에 건배를 - 그들은 왜 자살하기 위해 모였나? (0) | 2012.06.26 |
| [연극] 애국자들의 수요모임 - 애국자(?)들은 왜 모였나?! (0) | 2012.06.26 |
|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0) | 2012.06.26 |